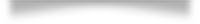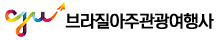하지만 정작 브라질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즐겁지가 않다. 경기장 건설이 늦어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고를 받았다는 외신에다, 월드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주변의 친구들도 걱정해올 정도다. 며칠 전 대화 중에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떻게 경제 대국인 브라질의 월드컵 준비가 남아공보다도 늦나?” “축구 열정이 그렇게 뜨거운 브라질 사람들이 월드컵에 반대하는 건 또 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들이었다.
사실 그렇다. 브라질 국민의 축구 사랑은 ‘종교’에 가깝다. 축구는 생활의 일부를 넘어 그 자체라고 할 정도다. 그런 국민이 세계 최대 축구 축제인 월드컵을 반대하고 나선 건 무슨 까닭에서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브라질의 최근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들어 브라질은 대표 신흥국인 이른바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2011년 브라질의 GDP는 2조4800억달러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요즘 축구장 완공이 문제라지만, 건설 능력만 해도 브라질은 6·25가 한창이던 1950년에 이미 세계 최대 축구경기장인 마라까낭(Maracanã) 구장을 지어 월드컵을 치렀을 정도였다. 경기장 수용 인원이 16만명(입석 포함 20만 명)이었다. 지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도 1960년대에 건설해 지금은 20세기에 건설된 도시들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에 등록됐을 정도다.
그런 브라질이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현지 소식에 따르면, 전체 12개 경기장 중 개막식이 치러질 상파울루의 이따께라웅(Itaquerão) 경기장을 포함해 5곳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경기장 건설만이 문제가 아니다.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회를 원활히 치르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같은 인프라도 미완의 숙제다. 브라질 정부는 월드컵 기간에 국내항공 1973편을 늘리기로 했지만 인프라 개선이 따라주지 못해 심각한 혼잡이 예상된다.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지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회견에서 경기장 건설은 물론 대도시 인프라 구축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가 2007년 브라질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15차 범미주경기대회(Jogos Pan-Americanos Rio 2007)’가 리우에서 열렸다. 당시 브라질의 대회조직위에 우리나라의 월드컵 개최 당시의 경험을 전해 주면서 브라질 사람들의 대회 준비를 유심히 지켜봤다. 이 대회는 월드컵과 리우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예행연습을 하듯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현지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그때 제기된 문제가 공사 지연과 과도한 예산 집행이었다. 리우의 범미주대회는 대회 사상 최고인 20억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교통난 대책의 일환으로 값비싼 헬기까지 도입하는 것을 보고 현지 언론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체육부장관은 범미주대회에 사용된 예산이 당초 예상의 10배에 달했다고 했다.
결국 대회가 끝난 후 감사원과 연방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대회 2년 후인 2009년 10월에야 예산 집행 과정의 부정을 문제삼아 관련자에게 돈을 국고에 반납하게 했다. 하지만 그마저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6월 2014년 월드컵 개최 비용으로 280억헤알(약 14조5000억원)을 발표했다. 그보다 2개월 전인 4월 발표치보다 10% 가량 늘어났다. 시위대가 들끓기 시작했다. 월드컵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285%나 증가했다면서, 월드컵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보건, 교육, 치안 확보, 주거환경 개선 같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예산은 대회 사상 최대 규모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5조2300억원, 2006년 독일 월드컵은 5조5400억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약 3조7800억원이 들었다. 브라질 월드컵 예산은 2002년이나 2006년 대회와 비교하면 3배, 2010년 대회보다 4배나 많다.
이런 예산 증가는 브라질 건설업자들과 정치권·관계의 유착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악습은 지금까지 브라질을 선진국이 되지 못하게 한 원인 중 하나다. 브라질은 그동안 자원, 인력, 기후 등 많은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선진국 목전에서 추락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브라질에서 사망한 극작가 츠바이크는 이런 사정을 두고, “브라질은 미래의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미래의 나라일 것이다”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최근 월드컵 반대 시위가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축구를 밥보다 좋아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대하는 것은 월드컵 개최가 아니라 고질적인 부정·부패인 것이다. 시위대들은 월드컵 예산이 부풀려졌으며, 이는 정치인들과 건설업체가 유착한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언론으로부터 아프리카의 월드컵보다도 준비가 못 하다는 지적이나 받으며 대국의 자존심까지 땅에 떨어뜨렸으니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다.
다급해진 것은 월드컵 개최 3개월 후에 있을 선거에서 재선을 꿈꾸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다. 월드컵의 성공 여부는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게 틀림없다. 그래서 호세프 대통령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리고 있는 2차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참석 도중에도 시위 대책 마련을 위해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공식 연설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메시지를 올려 국민 설득에 분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월드컵의 성공 여부는 남은 5개월 동안 호세프 정부가 국민의 월드컵 반대의 참뜻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내 설득하는 데 달렸다고 하겠다.
 즐겨찾기
즐겨찾기
 시작페이지
시작페이지 로그인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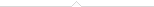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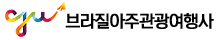

 커뮤니티
커뮤니티